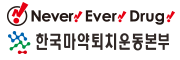△ 도토리묵. 오리지널이다
막걸리에 도토리묵은 늘 한 묶음의 관계이다. 산촌의 주막집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그래, 뭔가에 홀린 듯 도토리묵을 청해보지만 늘 후회하게 된다. 오리지널 도토리묵이 아니라는데 이유가 있다. 하지만 무슨 미련 때문인지 몰라도, 뻔한 도토리묵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다시 주문을 되풀이 한다.
기대 반 포기 반의 심정으로. 아무래도 어린 시절 즐겨 먹었던 추억의 음식이라 그런가 보다.
진짜 도토리묵 어디 없나?
당면순대를 먹고 자란 세대는 찹쌀순대의 맛에 감동할 줄 모른다.
오히려 당면순대에 입이 더 적응을 해버린 상태이다. 도토리묵도 당면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봄철에 녹기 시작하는 얼음을 밟을 때 쩍 금이 가는 것처럼, 젓가락만 대도 부셔지는 도토리묵.
시중의 음식점에선 대부분 이런 도토리묵이 팔리고 있다. 무미(無味)이기에 양념의 도움 없이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먹고 있으니 도토리묵이 원래 이런 맛인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을 것이란 짐작이다.
내 어린 시절 고향집 주변에는 키가 큰 상수리나무가 서너그루 서 있었다.
모내기철에는 꾀꼬리가 둥지를 틀어 새끼를 쳤고 나무 아래에서는 사슴벌레와 풍뎅이 말벌이 공생했다.
가을철이 되면 수확한 논으로 무수히 많은 상수리가 떨어졌다. 그것들을 주워오면 어머니는 묵을 쑤었었다.
비록 졸참나무 도토리묵은 아니지만 그때의 묵은 추억과 함께 묵에 대한 미각적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만큼 그때의 묵이 가장 맛있었던 것이다.
△ 도토리묵볶음, 말린 토토리묵을 물에 불려 들기름에 볶아냈다
성인이 되어 여러 음식점에서 묵을 접했지만 썩 만족스런 미각이 아니었다.
요리가 넘치는 세상이다 보니 구황식품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탓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추억이란 양념만으로 먹기에는 미각이 그리 자비롭지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1년에 두어번 명절에 제대로 된 묵을 먹곤 한다. 형이 구례 처갓집에 들렀다 오면서 장모님이 쑤신 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묵이 어찌나 차지던지 흔들면 부드럽게 찰랑거린다. 그래도 부셔지지는 않는다.
반으로 접으면 그대로 휘어질 정도이다. 분명 일반 묵과 다른 모양새다. 맛을 보면 더욱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따로 양념 없이 묵만 먹어도 쌉쓰름한 맛과 구수한 풍미에 혀가 반긴다.
때문에 이런 묵을 먹을 땐 양념을 끼얹는 것조차 불필요하다. 묵 무침은 더 더욱 금물이다.
제대로 된 묵은 그 자체가 맛있다.
산행철 하산 길에 도토리묵 한 접시 놓고서 막걸리 한사발로 마른 목을 적시는 건 어떨까?
가만 우리동네 어디 도토리묵 파는 데 없나? 난 늘 이렇다. 내 기준에 미달할 줄 알면서도 또 다시 도토리묵을 떠올린다. 난 어쩔 수 없는 촌놈인가 벼.
출처:http://blog.daum.net/kfs4079/17206438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황사의 발원지 쿠푸치 사막에 가다. (0) | 2011.04.29 |
|---|---|
| 백두산호랑이가 떴다! (0) | 2011.04.24 |
| 화려한 원색 새우란 보러 제주 오세요 (0) | 2011.04.24 |
| 가드닝(Gardening)의 즐거움 (0) | 2011.04.16 |
| 앙증맞고 개성 넘치는 조개껍데기 화분 만들기 (0) | 2011.04.16 |